김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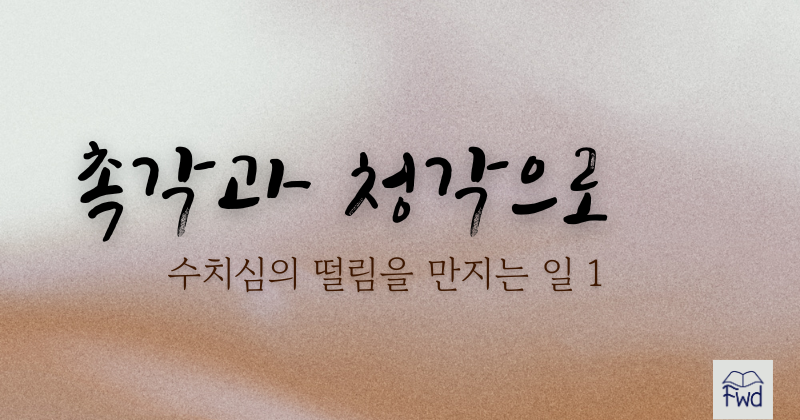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퀴어 코미디와 수치심의 정동 정치: 국내 퀴어 유튜브 및 팟캐스트 콘텐츠와 구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2024)을 발췌·요약하고, 이후의 기획 경험을 반영해 재구성한 글이다.
수치심은 우리의 뺨을 붉히고, 말을 더듬게 하고, 속을 비우게 하며, 몸의 표면에 구멍 같은 흔적을 남긴다. 이브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에게 그 구멍은 관계성의 가능성이다[1]. 내가 퀴어 코미디라는 소재에 매혹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치심은 주체를 열어젖히고, 서로에게 웃음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접촉을 허락하며, 매우 짧지만, 분명한 공동체의 순간을 구성한다. 웃기는 행위는 자기를 파는 일이며, 동시에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몸짓이다. 자기파괴적이지만 그래서 더 부끄러울수록 솔직한 실천이다.
[1] 이브 세즈윅(Eve Sedgwick)은 실번 톰킨스(Silvan Tomkins)의 감정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수치심을 “자아와 세계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정동”—즉, 주체가 이미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관계적 후퇴로 개념화한다(Sedgwick, 2003). 주체가 뒤로 물러서는 그 자리는 단순히 결핍을 표시하는 공백이 아니라, 타인이 주체에게 어떻게 접촉하고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그 흔적을 통해 주체는 다시 세계를 향해 돌아갈 가능성을 얻게 된다. 세즈윅이 보기에 수치심은 관계를 중단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욕망이 좌초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계에 대한 소망을 재차 환기시키는 정동이다.
그러나 논문을 마친 뒤 종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 결론들이 종종 너무 매끄러웠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회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었고, 수치심은 결코 안전한 감정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라는 말은 너무 쉽고 당연한 해결책처럼 호출되고 있었다. 공동체는 선언이 아니며, 누구나 초대되는 공간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지도 않는다. 공동체는 감정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화되어 있었고,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말하기’만이 존재할 뿐,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만들고 누가 소비하는지, 누가 배제되는지, 무엇이 유지 비용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비어 있었다.
사라 아메드(Sara Ahmed)에 따르면 수치심은 주체를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를 다시 세계에 “붙들어 매는 감정”이다(Ahmed, 2004).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는 이미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한다. 반대로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과 같이 수치심을 사회적·도덕적 결함으로 간주하며 제거되어야 할 감정으로 규정하는 이론가들도 있다(Nussbaum, 2004). 이 두 입장은 수치심의 성격을 상반되게 이해하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퀴어의 삶에서 수치심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응축된 경험이라는 점이다. 수치심은 떨쳐내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오래된 흔적이며, 그래서 퀴어 정동 이론은 이 감정을 ‘자부심(pride)’ 중심의 정체성 정치의 대안으로 사유해왔다. 수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치—즉, 부정성의 자원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성의 형성—은 분명 매혹적이고, 실제로 변혁적 잠재력을 지닌 비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며, 그 부담은 언제나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어떤 몸은 수치심을 더 자주, 더 깊게, 더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어떤 사람의 말하기는 해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일한 말하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 침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심을 퀴어 정치의 단일한 해결책이나 보편적 정동 자원으로 간주하는 순간, 그 정치 자체가 은폐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가려지게 된다. 수치심은 관계를 열기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관계를 열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내가 고민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수치심은 우리를 우리로 만들 수 있을까? 애초에 우리에게는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면—그것은 무엇을 감당해야만 실재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내 논문이 너무 순하게 믿었던 것들—수치심의 회복성, 코미디의 정동 정치, 공동체의 가능성—을 다시 묻고, 다시 뜯어보고, 다시 부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왜 나는 공동체로 돌아오는가, 그 끈질긴 욕망의 구조를 탐구하려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학교나 제도 밖에서 마주한 최근의 기획 활동들을 이론이 놓친 구체적 공동체성의 실험으로 읽고자 한다. 2025년 10월 나는 ‘퀴어 코미디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논문에서 신나게 떠들었던 ‘퀴어 코미디’를 위한 무대를 직접 만드는 기획에 참여했다. 학교와 제도 밖에서 퀴어 이론을 공부하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어쩌다 보니 너무 많은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내가 실제로 공동체를 ‘만져 본’ 경험들이다. 이곳에서 나는 사랑과 회복이란 정념이 가진 위험과 약속 사이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비로소,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1. ‘회복’은 구원이 아니다
수치심은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이다. “애초에 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상만이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Tomkins, 1995)”는 톰킨스의 문장은 내가 사랑해 마지않았던 문장이었고, 그 설득력은 여전하다. 나는 이 문장을 붙잡고 퀴어 코미디 속 자조의 순간들—자기 자신을 희화화하고, 자신의 불화하는 몸을 시장에 내놓는 행위—가 어떻게 타자에게의 접촉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그러나 수치심의 관계적 잠재성은 세즈윅 독해의 가장 큰 함정이 되기도 한다. 헤더 러브(Heather Love)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듯, 세즈윅의 ‘회복(reparation)’ 개념은 퀴어 이론 독자들 사이에서 거의 일종의 정서적 이상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Love, 2010)[2]. 러브는 세즈윅의 회복을 둘러싼 담론을 가리켜 “스승이 제공하는 부드러운 위안에 지나치게 쉽게 몰입한 학생의 사랑”이라고 묘사한다. 러브에게 중요한 것은 세즈윅의 회복이 치유나 통합, 긍정적 미래의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많은 독자—나 역시 포함된다—는 회복을 실천적 낙관주의, 즉 더 나은 감정적 관계성과 공동체 윤리의 기반으로 읽어 왔다.
[2] 이 글에서 인용하는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의 ‘회복(reparation)’ 개념은 그녀가 클라인(Melanie Klein)의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해석적·정동적 실천을 가리킨다(Sedgwick 2003; 2007). 세즈윅에게 퀴어는 본질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ity) 언어 행위이며, 이 때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미세한 떨림을 감각하는 것이 퀴어 정치의 핵심적 방법론이 된다. 특히 세즈윅은 기존 비평이 권력·억압·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데 몰두하는 ‘편집증적 읽기(paranoid reading)’의 강한 이론적 충동을 문제화하며, 긍정·부정의 정동을 양가적으로 포용하는 ‘회복적 읽기(reparative reading)’를 대안적 독해 윤리로 제시한다. 클라인의 ‘우울증적 위치(depressive position)’에서 차용한 회복은 파편화된 대상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상·애착·적대·애정이 공존하는 자리에서 텍스트와 세계를 다시 붙들어 보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정동의 위치를 뜻한다. 세즈윅이 구상한 회복은 강한 이론의 동일화 충동에서 벗어나 잔여적 정동, 균열, 모순을 감각하는 느리고 약한 이론의 실천이며, 퀴어 문화 텍스트를 읽고 관계하는 방식 그 자체를 정치적 실험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러브는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한다. 그녀는 회복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제공한다는 독해를 “회복을 회복적으로 읽으려는 강박(paranoia)”이라고 부른다 (Love, 2010). 역설적으로 편집증(paranoia)을 극복하는 실천으로 읽혀온 ‘회복’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편집증적 강박을 낳는다는 것이다. 세즈윅을 ‘따뜻한 스승’으로 이상화하는 순간, 독자는 이미 세즈윅이 지적했던 편집증적 독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러브가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회복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이 아니며, 주체 내부에서 샘솟는 정서적 윤리의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회복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손상·상처·충동·애정·적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는 관계적 운동이다.
러브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세즈윅의 회복 개념이 언제나 “손상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Love, 2010).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하다. 세즈윅이 말한 회복은 부서진 조각을 원래의 온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기술이 아니다. 회복이란, 손상을 인정하고, 그 손상이 남긴 잔여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 잔여를 끌어안은 채로 대상을 향해 다시 접근하는 느리고 모순적인 실천이다. 회복은 따뜻한 봉합이 아니라, 애착과 공격성이 공존하는 복잡한 애도의 형식이다. 러브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사랑은 대상을 치유하는 욕망만큼이나 그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포함하고 있다 (Love, 2010)”는 문장은 세즈윅의 회복을 지나치게 ‘선한 감정’으로 낭만화하는 독자들에게 정교한 균열을 낸다.
나의 석사 논문은 이러한 복잡한 층위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나는 세즈윅의 회복을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감정 체계처럼 묘사했다. 수치심이 관계적 가능성을 연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관계는 언제나 파손·오해·배신·폭력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점을 충분히 보기에 애초에 어떤 ‘구원’을 찾는 눈으로 세즈윅의 이론을 살폈다. 러브의 비판을 반영하자면, 나는 회복의 ‘자리’를 설명했을 뿐, 회복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지 않았다. 회복은 정돈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성과 충동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정동적 실천이며,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문제로서 끌어안고 유지하는 감정적 기술에 가깝다.
한국의 퀴어 현실에서 이러한 비판은 특히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애도되지 못한 상실, 반복되는 국가 폭력, 질병과 관련된 낙인, 불안정한 퀴어 공간들의 붕괴는 세즈윅적 의미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만든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러브의 목소리로 세즈윅의 논지가 다시 돌아온다. 그녀는 “치유의 언어가 때로는 고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복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때로는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Love, 2010). 회복의 정치가 너무 쉽게 희망을 약속할 때, 그 정치가 은폐하는 것은 언제나 회복 불가능한 손상들이다. 세즈윅의 회복은 목적론적 희망의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세즈윅의 위치는 언제나 beyond가 아니라 beside에 있다. 이는 발전·구원·미래·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곁에 머무르는 정동의 정치다.
따라서 회복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다시 써야 할 것이다. 회복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가?
아니면 손상된 상태에서 관계와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과정인가? 러브의 결론은 후자에 가깝다. 회복은 치유의 목적지가 아니라, 손상 이후에도 관계를 붙잡는 애착의 기술이며, 실패의 반복 자체가 그 실천의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나는 이론이 아닌 구체적 경험들에서 회복의 가능성들을 더듬어 나가며 비로소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가까워졌다.
2. 수치심은 평등하지 않다
수치심을 회복의 정동으로 읽는 이론적 우아함은 현실의 들끓는 감정들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수치심이 이토록 관계적 정동이라면, 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대부분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질까? 수치심이 새로운 관계성의 가능성이라면, 왜 어떤 삶에서는 수치심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구적 낙인과 고립의 원인이 되는가? 세즈윅의 통찰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동일한 감정 안에서도 각기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동은 분배되며, 그 분배는 평등하지 않다.
마사 누스바움은 수치심을 전적으로 부정적 정동으로 간주한다. 그녀에게 수치심은 “다수자의 자기애적 이상이 소수자에게 투사된 결과 (Nussbaum, 2004)”이다. 이 관점에서 수치심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정치적 자원이 아니다. 물론 이 주장이 수치심을 지나치게‘부정적 감정’으로만 분류하는 단순화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해도, 누스바움이 지적하는 수치심의 정치적 ‘맥락’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치심은 언제나 계급적·성별적·인종적 권력의 문법 속에서 작동한다. 샌드라 바트키(Sandra Bartky)는 이를 더 명확히 한다. 그녀에게 수치심은 여성·소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열등감의 구조를 체화시키는 메커니즘 (Bartky, 1990)”이다.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은 극복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장애물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축적된 만큼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버리는 부정성의 침전물이다.
이 지점에서 잭 핼버스탬(J. J. Halbertam)의 비판은 결정적이다. 핼버스탬은 “수치심을 대안적 정동으로 낭만화하는 퀴어 이론의 경향 (Halberstam, 2005)”을 문제 삼으며, 수치심이 전복성을 갖는다는 명제 자체가 이미 특정 계급·인종·젠더의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수치심은 어떤 몸에서는 ‘놀이’나 ‘실험’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몸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은 코미디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은 무대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자조적 농담은 해방으로 이어지지만, 또 어떤 자조적 농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더욱 비가시화하고 대상화한다. 정동의 분배는 결코 평등하지 않고, 수치심이 전복·연대·회복과 같은 훌륭한 ‘퀴어적’ 가치들을 약속한다는 말은 특정한 삶에만 해당하는 진실일 수 있다.
‘퀴어 코미디 나잇’이라는 현장에서 나는 이 불평등한 수치심의 분배를 몸으로 확인했다. 어느 코미디언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농담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했고, 그 농담은 공간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어떤 참가자는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 이때 수치심은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벽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핼버스탬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이다; 수치심은 해방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해방은 아니다. 수치심을 무조건적으로 ‘전복적 감정’으로 찬양하는 순간, 퀴어 정치와 문화 실천은 또 하나의 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즉 “수치심을 잘 견디는 것이 올바른 퀴어 주체성”이라는 식의 새로운 규범성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규범은 수치심을 감당할 자원(계급, 인종, 교육, 정서적 여유)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정동적 특권으로 전락한다. 수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몸과 수치심에 “파괴되는” 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치심 기반의 공동체론은 오히려 폭력적이 될 수 있다.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가 수치심을 “퀴어한 사회성의 핵심 (Warner, 2000)”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수치심을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치심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관계적이고 비대칭적이며, 그 비대칭을 끊임없이 감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 논문은 수치심의 이 긍정적 측면만을 과하게 확대한 면이 있다. 나는 “모두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존엄하다”는 워너의 논의가 사회적 현실의 불평등을 가리는 문장이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 수치심의 윤리를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수치심의 구조적 불평등을 충분히 밝혔어야 했다.
퀴어 코미디는 이러한 논점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무대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상처는 농담으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상처는 농담으로 말하는 순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어떤 트라우마는 청중에게 웃음을 주며 승화되지만, 어떤 트라우마는 공간에 말 그대로 “말해지지 않는 잔여”만을 남긴다. 수치심은 관계를 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닫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치심을 다시 전유하는 것보다, 어떤 수치심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분배의 비대칭이 어떻게 문화 실천의 장에서 재현되고 재-강화되는지를 섬세하게 보는 감각이다. 따라서 수치심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전복적 감정”도, “정치적 자원”도, “치유의 매개”도 아니다. 적어도 항상 그렇지는 않다. 수치심은 그저—관계와 고립이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위험한 접촉면이다. 사랑처럼, 연대처럼, 수치심도 ‘좋은 감정’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다. 이 복잡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동체도, 어떤 회복도, 어떤 코미디도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2편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
- Ahmed, S.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artky, S. L.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Routledge.
- Bersani, L. (1987). Is the rectum a grave? October, 43, 197–222.
- Dean, T. (2006). The antisocial homosexual. PMLA, 121(3), 826828.
- Edelman, L. (2004).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 Halberstam, J. (2005). Shame and white gay masculinity. Social Text, 23(3–4), 219–233.
- Love, H. (2010). Truth and consequences: On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Criticism, 52(2), 235–241.
- Nussbaum, M. C. (2004). Hiding from humanity :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dgwick, E. K. (2003).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or, You’re so paranoid, you probably think this essay is about you. In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pp. 123–151). Duke University Press.
- Sedgwick, E. K. (2007). Melanie Klein and the difference affect makes. In J. Halley & A. Parker (Eds.), After sex? On writing since queer theory (Special issue). South Atlantic Quarterly, 106(3), 625–642.
- Tomkins, S. (1995). Shame. In E. K. Sedgwick & A. Frank (Eds.), Shame and its sisters: A Silvan Tomkins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 Warner, M. (2000). The trouble with normal: Sex, politics, and the ethics of queer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