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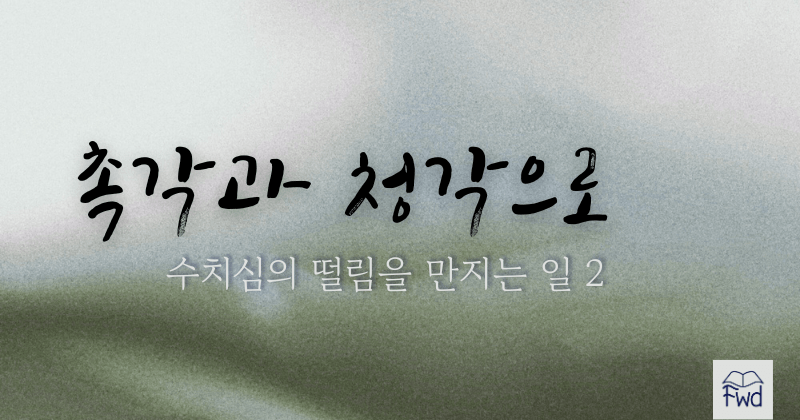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퀴어 코미디와 수치심의 정동 정치: 국내 퀴어 유튜브 및 팟캐스트 콘텐츠와 구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2024)을 발췌·요약하고, 이후의 기획 경험을 반영해 재구성한 글이다.
3. 공동체는 부서지는 것이다
공동체는 언제나 이미 균열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수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가깝다. 공동체는 구축되었다가, 균열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연속적 사건(event)이다. 공동체의 부서짐을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조건으로 읽기 위해서는 퀴어 부정성(queer negativity), 즉 버사니(Leo Bersani)와 에델만(Lee Edelman)과 같은 이들이 제기한 반(反)사회적 테제(antisocial thesis)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1].
[1] 퀴어 부정성은 퀴어가 ‘반사회적 존재’라는 낙인을 거꾸로 해석이브 세즈윅(Eve Sedgwick)은 실번 톰킨스(Silvan Tomkins)의 감정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수치심을 “자아와 세계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정동”—즉, 주체가 이미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관계적 후퇴로 개념화한다(Sedgwick, 2003). 주체가 뒤로 물러서는 그 자리는 단순히 결핍을 표시하는 공백이 아니라, 타인이 주체에게 어떻게 접촉하고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그 흔적을 통해 주체는 다시 세계를 향해 돌아갈 가능성을 얻게 된다. 세즈윅이 보기에 수치심은 관계를 중단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욕망이 좌초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계에 대한 소망을 재차 환기시키는 정동이다.
퀴어 부정성 이론은 흔히 오해되곤 한다. “퀴어는 공동체 따위 필요 없다”, “미래를 포기하라”, “죽음 충동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황당한 요약이 떠돌곤 하지만, 퀴어 부정성이 말하는 “반사회성”은 결코 실제적 반사회성(타자에 대한 공격성, 고립, 반관계성)이 아니다. 팀 딘(Tim Dean)은 이를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한다. “퀴어가 구조적으로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퀴어가 경험적으로 반사회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즉,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규정하는 기준이 이미 시스‧이성애‧가족‧재생산의 규범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퀴어는 구조적으로 그 틀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Dean, 2006). 퀴어의 반사회성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퀴어 부정성은 공동체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자’는 급진적 제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부서짐은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퀴어 공동체란 언제나 상처 난 몸들의 집합이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매우 물질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폭력의 기억, 상실, 애도되지 않은 비통함, 제도적 배제, 계급적 차이, 트라우마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모인다. 모여서 서로를 온전히 위로하기보다는, 때로는 곁에서 흔들리고 울리고 충돌하며 존재한다. 퀴어 공동체의 정동은 언제나 과잉, 결핍, 피로, 분노, 사소한 질투, 망설임, 열망의 뒤엉킴 속에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부서진 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로렌 벌렌트(Lauren Berlant)의 말처럼 퀴어 정치가 “주체 내부에서 시작하는 회복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기대면, 그것은 공동체의 재료들을 비가시화한다 (Berlant, 2002). 벌렌트는 개인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서사가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퀴어 운동의 맥락에서도 이는 뼈아프게 와 닿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노동, 자본, 공간, 제도적 위험, 정서적 손실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다시 내가 논문에서 한 말들을 물질화하는 작업들로 돌아오게 된다. 공동체라는 말 뒤에는 절대 가볍지 않은 물질적 비용과 노동이 깔려 있다; 예컨대 한 번의 ‘퀴어 코미디 나잇’ 오픈마이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간 대여비, 모객, 음향 장비, 안전한 귀가, 참여자 관리, 갈등 중재, SNS 홍보, 기획자들의 소진과 번아웃, 무급 노동, 누군가의 사적 비용…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조건을 이루는 재료들이다. 공동체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해와 누군가의 호의, 그리고 수많은 결정과 갈등 조정의 연속으로만 유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농담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고통은 무대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 어떤 트라우마는 끝내 발화되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얻지만, 또 어떤 사람은 “웃기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공동체는 이런 균열과 실패를 포함한 채로만 실재한다.
버사니가 성적 관계의 가치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의 통찰은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Bersani, 1987). 공동체가 안전하고 영속적인 형태로만 상상될 때, 그 공동체는 이미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선언은 언제나 누군가를 배제한다. 선언되지 않은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진입 조건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추상화, 낭만화, 익명화된 ‘연대’의 말 뒤로 사라진다. 퀴어 공동체가 윤리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공동체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실패 자체를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델만이 말하는 “목적론적이지 않은 부정성”의 정치다. 공동체는 어떤 목적도 약속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구원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시 시도될 수 있다. “웃고 떠드는 장”이 주는 쾌락은 그 장이 얼마나 쉽게 균열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논문에서 퀴어 코미디를 “연결”과 “생존”의 기제로 다소 낭만적으로 설명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치스럽고 천박하며 쓸모 없어 보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퀴어 코미디는 공동체의 핵심 윤리적 지점을 드러낸다. “쓸모없는 실천을 배신하지 않는 것”—정치적 효과를 요구하는 모든 프레임에 저항하며 순수하게 과잉적인 정동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퀴어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일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퀴어 부정성과 공동체는 다시 맞물린다. 공동체는 밝고 뽀얗고 정결한 유대가 아니라, 항상 어딘가가 끈적이고 기울고 부서져 있는 정동의 잔여물들의 네트워크다. 그 잔여가 바로 공동체의 물질성이다.
4. 우리가 공동체를 만질 때
앞선 장들에서 나는 회복, 수치심, 부정성, 공동체라는 퀴어 이론의 핵심 어휘들이 얼마나 쉽게 추상적 이상으로 공고화되는지를 검토해왔다. 그 말들은 지면 위에서는 일관된 서사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퀴어 공간—특히 내가 직접 몸을 들여 참여한 퀴어 기획들—에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재료들과 충돌하며 예상치 못한 균열을 드러낸다. 공동체는 언제나 “완성된 구조”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조정, 실패의 관리, 감정의 누수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퀴어라는 개념은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포용적이다. 누구든 퀴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신이 ‘이미 충분히 퀴어하다’고 스스로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 이 느슨하고 불안정한 포용성은 퀴어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모든 시도에 필연적 난점을 부여한다. 그 난점이 바로 번역(translation)과 인용(citation)의 노동이다. 퀴어 세미나에서, 코미디 무대에서, 혹은 워크숍에서 나는 서로 다른 경험·정동·언어·트라우마·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하고, 누군가가 그 신호를 듣고, 그 떨림을 해석해야 하며, 서로의 위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 번역 작업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오독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것은 퀴어 이론과 함께 퀴어 공동체가 갖는 유일한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다.
고래는 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소리를 발사한다. 이 음파가 주변 지형이나 다른 고래의 몸에 부딪혀 돌아올 때, 고래는 반사파의 속도·강도·떨림·변조를 해독하여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 기술은 단지 생존을 위한 감지 기제가 아니라, 관계의 형성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교한 비유이기도 하다. 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반향정위(echolocation)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느낀다.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 처음 만나는 텍스트를 읽는 일, 무대에 올라 농담을 던지는 일—이 모든 행위는 불확실성 속으로 신호를 보내는 시도이며, 그 신호가 어떤 떨림으로 되돌아오는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관계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공동체는 특정한 정체성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반향이 돌아오는 방식—즉 관계적 떨림—을 통해 성립한다. 중요한 점은 이 반향이 항상 불완전하고, 때로는 위험하며,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가 반향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왜곡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공동체를 정치적 가치로서만 말하는 언어들이 종종 이 복잡성을 지워 버리지만, 실제로 공동체는 “우리”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지속적 조율의 과정에 가깝다.
반향정위가 실패하면 고래는 표류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도 신호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실과 단절을 경험한다. 특히 퀴어 문화 행사의 기획 현장에서 나는 공동체의 실패가 예외나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조건임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반향정위의 핵심은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정하는 것”에 있다. 공동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실패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의 반복—즉 “다시 해보기”—는 아마추어리즘의 정치와 닿아 있다. 아마추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다. 퀴어 코미디 나잇의 무대에 선 이들에게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보내는 일, 즉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 신호를 받아준다면—그것이 비록 불완전한 반향일지라도—그 단 한 번의 반향이 공동체를 생성한다. 공동체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어설픈 연결의 시도들로 구성된 시간성이다.
5. (다시) 회복
나는 논문을 쓰는 동안 수치심의 정동 정치, 회복, 그리고 퀴어 공동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반짝이는 것으로 다루었다. 이론의 언어는 지면 위에서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완결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 매끄러움은 때로 나 자신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위치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완결성은 현실의 공동체가 가진 분열, 불균등한 정동의 분배, 실패와 붕괴의 물질성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수치심은 예측 불가능했고, 어떤 몸에게는 훨씬 잔혹했으며, 회복은 종종 책임을 떠넘기는 기제로 기능했다. 많은 퀴어 기획은 사람들의 “호의”와 “손해”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그 어떤 개념이나 감정에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값을 부여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 퀴어 유토피아는 없다. 이상화의 언어는 공동체의 현실을 우리의 감각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 깨달음은 나를 어리숙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그 어리숙함—정확히 말하자면, 나 자신의 미숙함이 만들어낸 수치심—때문에 나는 다시 쓰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
바로 그 “다시 돌아옴” 자체가 수치심의 작용일 것이다. 내가 쓴 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수치스럽다. 아마도 내가 그 논문을 사랑으로 썼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고, 퀴어 정치·정동·문화의 회복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실천들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너무나도 솔직하고 미숙한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세즈윅과 톰킨스가 말하듯, 수치심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가 논문으로 돌아가고, 그 문장들을 다시 읽고, 다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치심과 사랑은 서로를 비추며, 나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이상화의 형태로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상적인 것들은 공동체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상적이지 않은 것들—불완전함, 파손, 어설픔, 실패—이야말로 공동체가 작동하는 조건이자 힘이다. 내가 세즈윅의 글을 사랑하는 이유도 사실 이론이 제공하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그 희망의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균열, 편집증적 긴장, 모순의 지층 때문이다. 세즈윅을 사랑하기 마지않았던 러브가 지적하듯, 세즈윅을 무조건적 치유의 스승으로 이상화하는 순간 우리는 세즈윅이 경고했던 편집증적 독해를 되풀이하는 모순에 빠진다. 회복은 목적론적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손상과 애정, 공격성과 애착이 뒤엉킨 바로 그 자리에서 곁에 머무르려는 느리고 지저분한 선택이다.
나는 결국 세즈윅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귀환은 더 이상 이상화의 반복이 아니다. 스승이나 이론을 미래의 약속처럼 붙잡으려 했던 이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즈윅의 글 속에 남아 있는 편집증, 균열, 손상 자체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더 나은 곳’을 향한 편집증적 갈망을 경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손상된 자리—이미 어긋나 있고 완성되지 않은 관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빛나는 이론의 약속보다, 어둠 속에서 되돌아오는 미세한 떨림, 촉각과 청각으로만 감지되는 관계의 반향에 더 오래 귀 기울이려 한다. 공동체 역시 그런 식으로만, 손상과 어둠 속에서 되돌아오는 작은 반향들 속에서만 진짜로 만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회복은 해결이나 종결이 아니라, 조각난 상태를 인정하고 그 조각들을 촉각과 청각으로 다시 더듬어 보는 감각이다. 다시 만져보고, 다시 듣고,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 감각. 퀴어 정치 전체가 필연적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나 역시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다시 공동체 비슷한 것을 만든다. 이곳이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바로 그렇기 때문에—나는 다시 손을 뻗어 조각들을 모은다. 공동체는 완전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부서진 조각들이 울리는 잔향 속에서만 방향을 찾는다. 이것이 내가 다시 회복을 말하는 방식이며, 수치심의 떨림을 만지는 일이다.
참고 문헌
- Ahmed, S.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artky, S. L.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Routledge.
- Bersani, L. (1987). Is the rectum a grave? October, 43, 197–222.
- Dean, T. (2006). The antisocial homosexual. PMLA, 121(3), 826828.
- Edelman, L. (2004).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 Halberstam, J. (2005). Shame and white gay masculinity. Social Text, 23(3–4), 219–233.
- Love, H. (2010). Truth and consequences: On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Criticism, 52(2), 235–241.
- Nussbaum, M. C. (2004). Hiding from humanity :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dgwick, E. K. (2003).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or, You’re so paranoid, you probably think this essay is about you. In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pp. 123–151). Duke University Press.
- Sedgwick, E. K. (2007). Melanie Klein and the difference affect makes. In J. Halley & A. Parker (Eds.), After sex? On writing since queer theory (Special issue). South Atlantic Quarterly, 106(3), 625–642.
- Tomkins, S. (1995). Shame. In E. K. Sedgwick & A. Frank (Eds.), Shame and its sisters: A Silvan Tomkins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 Warner, M. (2000). The trouble with normal: Sex, politics, and the ethics of queer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